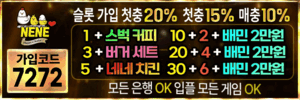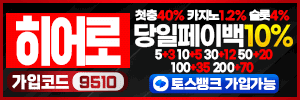그녀&그년 - 프롤로그
2019.01.23 22:40
언제나 첫 만남은 떨린다.
내 머릿속은 무엇을 상상하는지. 나도 모르는 상상들로 가득차서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니 그분을 만나러 가는 전 날 밤부터 보지가 축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평소엔 잘 하지도 않는 화장을 하고, 높은 구두도 꺼내 신고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날 때마다 내 심장도 두근두근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았다.
약속장소에 도착해 연락을 드리니
‘난 아직 도착 안했어요. Y라는 이름으로 예약했다고 하세요.’
라는 문자가 왔다.
조용한 한식당의 룸.
기다리는 내내 혼자 또 상상에 가득 차 있었다.
약속시간 정각이 되자 방문이 열리고 그분이 도착하셨다.
나보다도 작으신 체구에 하얗고 선한 인상의 그 분.
그동안 나와 연락을 해왔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의 첫인상이었다.
꼭 청순가련한 유치원 선생님 같은,
그렇다고 에세머나 변태들이
나 변태요 하고 얼굴에 써 붙이고 다니는건 아니지만
내가 상상했던 이미지는 아니셨다.
난 참 어색하게 일어나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 기색도 없었다.
오랜만에 친한 동생을 만난 듯이 생글생글 웃으시며
반갑다는 인사를 하셨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나는 음식을 내오시는 분들이 혹 우리얘길 들을까봐
조마조마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만 겨우 하는데도
그분은 연신 웃는 표정으로 적나라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도 밥 먹을 땐 으레 이런 변태스런 이야기들을 하는 양 말씀하셨다.
“털은 잘 정리하고 나왔어요?”
“네? 네. 어제 왁싱했어요.”
“잘했어요. 난 지저분한 보지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지금 브라는 뽕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젖은 왠지 제가 좋아하는 크기일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웃는 얼굴로, 존댓말로 듣고 있으려니 적응이 안됐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수치스럽고 흥분됐다.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식사를 끝내고
그분의 차 앞에 섰다.
검정색의 SUV차량.
역시 그분의 이미지랑 어울리지 않는 차라고 생각했다.
“밥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난 P씨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데.”
“저도 그래요.”
“좋아요. 그치만 존대는 여기까지에요. 인간대접도 여기까지구요.
차에 타면 난 P씨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거에요.”
“네.”
“동의하면 차에 타요.”
네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이러다 터지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인간인 내가 인간이 아닌 대접을 받는다는 것.
“뭐해요, 탈거에요?”
“네.”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Y씨가 내 손을 탁 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트렁크 쪽으로 가셔서 트렁크 문을 여셨다.
“여기야. 니 자리는.”
도톰한 담요가 깔려있는 트렁크.
나도 원래 트렁크가 내 자리인양 하이힐을 벗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트렁크 문이 닫히면서 나와 주인님의 관계는 시작되었다.
내 머릿속은 무엇을 상상하는지. 나도 모르는 상상들로 가득차서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니 그분을 만나러 가는 전 날 밤부터 보지가 축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평소엔 잘 하지도 않는 화장을 하고, 높은 구두도 꺼내 신고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날 때마다 내 심장도 두근두근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았다.
약속장소에 도착해 연락을 드리니
‘난 아직 도착 안했어요. Y라는 이름으로 예약했다고 하세요.’
라는 문자가 왔다.
조용한 한식당의 룸.
기다리는 내내 혼자 또 상상에 가득 차 있었다.
약속시간 정각이 되자 방문이 열리고 그분이 도착하셨다.
나보다도 작으신 체구에 하얗고 선한 인상의 그 분.
그동안 나와 연락을 해왔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의 첫인상이었다.
꼭 청순가련한 유치원 선생님 같은,
그렇다고 에세머나 변태들이
나 변태요 하고 얼굴에 써 붙이고 다니는건 아니지만
내가 상상했던 이미지는 아니셨다.
난 참 어색하게 일어나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분은 전혀 그런 기색도 없었다.
오랜만에 친한 동생을 만난 듯이 생글생글 웃으시며
반갑다는 인사를 하셨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나는 음식을 내오시는 분들이 혹 우리얘길 들을까봐
조마조마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만 겨우 하는데도
그분은 연신 웃는 표정으로 적나라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도 밥 먹을 땐 으레 이런 변태스런 이야기들을 하는 양 말씀하셨다.
“털은 잘 정리하고 나왔어요?”
“네? 네. 어제 왁싱했어요.”
“잘했어요. 난 지저분한 보지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지금 브라는 뽕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젖은 왠지 제가 좋아하는 크기일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웃는 얼굴로, 존댓말로 듣고 있으려니 적응이 안됐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수치스럽고 흥분됐다.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식사를 끝내고
그분의 차 앞에 섰다.
검정색의 SUV차량.
역시 그분의 이미지랑 어울리지 않는 차라고 생각했다.
“밥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난 P씨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데.”
“저도 그래요.”
“좋아요. 그치만 존대는 여기까지에요. 인간대접도 여기까지구요.
차에 타면 난 P씨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거에요.”
“네.”
“동의하면 차에 타요.”
네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이러다 터지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인간인 내가 인간이 아닌 대접을 받는다는 것.
“뭐해요, 탈거에요?”
“네.”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Y씨가 내 손을 탁 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트렁크 쪽으로 가셔서 트렁크 문을 여셨다.
“여기야. 니 자리는.”
도톰한 담요가 깔려있는 트렁크.
나도 원래 트렁크가 내 자리인양 하이힐을 벗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트렁크 문이 닫히면서 나와 주인님의 관계는 시작되었다.
인기 야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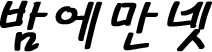
 밤에만넷
밤에만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