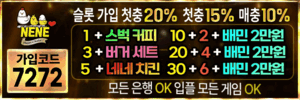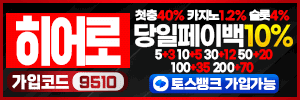절망의 나락 속에서... - 12부
2018.10.04 16:40
12장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은 각별했다. 그녀는 내게 율희를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도 그랬지만 갈등 없이 승낙하는 그녀의 모습은 지난날의 고민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 그녀는 내 부탁을 들어준 것이다.
“그래 보여? 사실 꽤 즐거워. 고마워.”
“응. 종례 전에는 보자.”
종례 전까지 율희를 반납하라는 말.
“응. 그때 볼게. 수업 잘 들어.”
율희는 살짝 말없는 미소를 보여주고는 교실로 향했다. 구두 약속이었기에 막상 빌려줄까 걱정했던 것은 기우로 지나갔고 혹이나 기분 상해있을까 염려한 것도 기우였다. 모든 것이 평화롭다. 적어도 나에게는. 혜지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양호실 앞에 도착했다.
“저 수현이에요. 들어가요.”
“어, 들어와~”
양호선생은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다. 꽤 이름 있는 가문의 기대주였다고 들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가 양호선생을 맡고 있다. 물론 젊고 예쁜 양호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인기는 좋았지만 다른 선생과는 출신부터 다른 신분이었기에 아무도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
“담배 냄새!”
“아직 냄새 나? 환기시킬게.”
선생이 머리를 긁적이며 창문을 여는 사이 나는 한 침대로 다가간다. 커튼이 쳐져있지만, 내 목소리를 듣고는 작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망설임 없이 커튼을 드르륵 걷었다.
“안녕 율희?”
“아, 안녕하세요. 수현님”
놀란 기색을 숨기지도 않고 담요를 턱까지 끌어당겨 앉은 그녀의 모습이 무척 귀엽다. 물기가 체 가시지 않은 큰 눈에 작은 떨림마저도 너무나 생동감있어 나는 웃고 만다.
“몸은 좀 괜찮아?”
“예. 덕분에 이젠 괜찮아요.”
“덕분에? 그럼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
“아, 아뇨.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만 쉽게 당황이 가시지 않는 모양이다. 아마 남자에게 꽤 귀여움 받을 타입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나는 율희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학기 초에 갑자기 나타났고, 그 이전의 그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아니 애초에 그녀에게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존재했는지.
“저는, 저는 그냥…”
“됐어, 그보다 기억해?”
“예?”
율희의 얼굴이 확 붉어진다. 아무래도 내 말을 잘못 이해한 모양이다. 나는 그 오해를 정정해 주었다.
“아니, 오늘 교실에서의 일 말고.”
그녀 빨개진 얼굴을 숨기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별로 그것에 트집을 잡고 싶지는 않았다.
“오늘 아침 너, 빌리기로 했던 거 말이야. 너 임대 됐어. 반납 할 때까지는 내가 네 주인이라는 이야기지.”
“네?”
“했던 말 다시하게 하지 마. 반납 전까지는 내가 네 주인이라고.”
“…예”
“뭐지? 그 힘없는 대답은”
“아, 아니에요. 저 정말 기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럼 나가자.”
나는 뒤돌아 양호선생에게 작별인사를 나누기 위해 걸었지만 곧 멈추고 말았다. 따라오는 율희의 발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늦장을 부리는군. 그녀를 처벌할 구실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바라본 그녀는 아직도 침대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뭐야?”
“저, 수현님. 저 옷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갈까 하고….”
“하? 지금 나랑 농담하는 거야?”
율희의 얼굴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해진다.
“아니, 아니에요. 그냥 나갈게요.”
덜덜 떨며 후다닥 이불 밖으로 나오는 그녀를 보며, 나는 약간의 불안이 생겼다. 나는 혜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율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몇몇 선생은 그것을 지적할지 몰랐다. 혜지에게는 아무 소리 못하지만 나 같이 배경이 없는 학생에게 강해지는 몇몇 쓰레기 같은 교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야 모처럼 준비한 약속도 의미가 사라진다.
“됐어. 선생님? 남는 옷 없어요?”
“얘는? 여기가 옷가게니?”
“환자복이라도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함부로 빌려주면 안돼. 나 혼나.”
“남는 헝겊 쪼가리라도 없어요?”
“음~ 잠깐만”
양호 선생은 잠시 고민하더니,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담배꽁초부터 만화책, 맥주 캔이 나오고 나서야 깊숙한 곳에서 말 그대로 헝겊을 꺼냈다.
“찾았다! 예전에 교감선생님이 입던 건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쓸 데가 아무데도 없었어. 이런 거라도 쓸래? 그것도 상의뿐인데.”
“예. 고마워요. 선생님.”
“하하 뭘~ 쓰고 버려. 알았지? 다시 갖다 주지 마. 쓰레기만 돼.”
쓰레기라는 건 둘째 치고 도대체 서랍에 왜 저런 것이 들어있는 거야. 강하게 밀려오는 양호선생의 업무능력에 대한 의문을 뒤로 옷을 율희에게 건네주었다. 호기심의 해결보다는 보다 값지게 시간을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
알몸이 부끄러운지 커튼 뒤에 숨어 옷을 입는 그녀의 모습은 조금 귀엽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역시 이상하다. 오늘 1교시 교실에서 맞으며 절정에 이르는 변태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아니, 오히려 평소의 그녀였으면 오늘 아침과도 같은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를 종종 괴롭혀오던 내가 봤을 때, 그녀는 절대 마조키스트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익숙해질 법도 한 상황에서도 남들 이상의 수치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통을 두려워한다. 즐긴다-로 전환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니 그보다는 그런 심한 상처가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낫는단 말인가? 커튼 틈으로 살짝 보이는 그녀의 엉덩이는 아기의 피부처럼 하얗고 매끈하다.
“저, 다 입었어요. 수현님.”
“가자. 선생님 신세 졌어요.”
“그래. 또 놀러오렴.”
양호선생이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어준다. 그 얼굴에 차마 놀러온게 아니라는 말을 하지는 못한 것은 지금부터 공부하러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마 선생도 율희도 짐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용히 양호실 밖으로 나왔다. 행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따라와.”
“예.”
----<12장 end>
정신없네요. 봄이라는 건.
[email protected]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은 각별했다. 그녀는 내게 율희를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도 그랬지만 갈등 없이 승낙하는 그녀의 모습은 지난날의 고민을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 그녀는 내 부탁을 들어준 것이다.
“그래 보여? 사실 꽤 즐거워. 고마워.”
“응. 종례 전에는 보자.”
종례 전까지 율희를 반납하라는 말.
“응. 그때 볼게. 수업 잘 들어.”
율희는 살짝 말없는 미소를 보여주고는 교실로 향했다. 구두 약속이었기에 막상 빌려줄까 걱정했던 것은 기우로 지나갔고 혹이나 기분 상해있을까 염려한 것도 기우였다. 모든 것이 평화롭다. 적어도 나에게는. 혜지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양호실 앞에 도착했다.
“저 수현이에요. 들어가요.”
“어, 들어와~”
양호선생은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다. 꽤 이름 있는 가문의 기대주였다고 들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가 양호선생을 맡고 있다. 물론 젊고 예쁜 양호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인기는 좋았지만 다른 선생과는 출신부터 다른 신분이었기에 아무도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
“담배 냄새!”
“아직 냄새 나? 환기시킬게.”
선생이 머리를 긁적이며 창문을 여는 사이 나는 한 침대로 다가간다. 커튼이 쳐져있지만, 내 목소리를 듣고는 작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망설임 없이 커튼을 드르륵 걷었다.
“안녕 율희?”
“아, 안녕하세요. 수현님”
놀란 기색을 숨기지도 않고 담요를 턱까지 끌어당겨 앉은 그녀의 모습이 무척 귀엽다. 물기가 체 가시지 않은 큰 눈에 작은 떨림마저도 너무나 생동감있어 나는 웃고 만다.
“몸은 좀 괜찮아?”
“예. 덕분에 이젠 괜찮아요.”
“덕분에? 그럼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
“아, 아뇨.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만 쉽게 당황이 가시지 않는 모양이다. 아마 남자에게 꽤 귀여움 받을 타입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나는 율희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학기 초에 갑자기 나타났고, 그 이전의 그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아니 애초에 그녀에게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존재했는지.
“저는, 저는 그냥…”
“됐어, 그보다 기억해?”
“예?”
율희의 얼굴이 확 붉어진다. 아무래도 내 말을 잘못 이해한 모양이다. 나는 그 오해를 정정해 주었다.
“아니, 오늘 교실에서의 일 말고.”
그녀 빨개진 얼굴을 숨기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별로 그것에 트집을 잡고 싶지는 않았다.
“오늘 아침 너, 빌리기로 했던 거 말이야. 너 임대 됐어. 반납 할 때까지는 내가 네 주인이라는 이야기지.”
“네?”
“했던 말 다시하게 하지 마. 반납 전까지는 내가 네 주인이라고.”
“…예”
“뭐지? 그 힘없는 대답은”
“아, 아니에요. 저 정말 기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럼 나가자.”
나는 뒤돌아 양호선생에게 작별인사를 나누기 위해 걸었지만 곧 멈추고 말았다. 따라오는 율희의 발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늦장을 부리는군. 그녀를 처벌할 구실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바라본 그녀는 아직도 침대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뭐야?”
“저, 수현님. 저 옷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갈까 하고….”
“하? 지금 나랑 농담하는 거야?”
율희의 얼굴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해진다.
“아니, 아니에요. 그냥 나갈게요.”
덜덜 떨며 후다닥 이불 밖으로 나오는 그녀를 보며, 나는 약간의 불안이 생겼다. 나는 혜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율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몇몇 선생은 그것을 지적할지 몰랐다. 혜지에게는 아무 소리 못하지만 나 같이 배경이 없는 학생에게 강해지는 몇몇 쓰레기 같은 교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야 모처럼 준비한 약속도 의미가 사라진다.
“됐어. 선생님? 남는 옷 없어요?”
“얘는? 여기가 옷가게니?”
“환자복이라도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함부로 빌려주면 안돼. 나 혼나.”
“남는 헝겊 쪼가리라도 없어요?”
“음~ 잠깐만”
양호 선생은 잠시 고민하더니,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담배꽁초부터 만화책, 맥주 캔이 나오고 나서야 깊숙한 곳에서 말 그대로 헝겊을 꺼냈다.
“찾았다! 예전에 교감선생님이 입던 건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쓸 데가 아무데도 없었어. 이런 거라도 쓸래? 그것도 상의뿐인데.”
“예. 고마워요. 선생님.”
“하하 뭘~ 쓰고 버려. 알았지? 다시 갖다 주지 마. 쓰레기만 돼.”
쓰레기라는 건 둘째 치고 도대체 서랍에 왜 저런 것이 들어있는 거야. 강하게 밀려오는 양호선생의 업무능력에 대한 의문을 뒤로 옷을 율희에게 건네주었다. 호기심의 해결보다는 보다 값지게 시간을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
알몸이 부끄러운지 커튼 뒤에 숨어 옷을 입는 그녀의 모습은 조금 귀엽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역시 이상하다. 오늘 1교시 교실에서 맞으며 절정에 이르는 변태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아니, 오히려 평소의 그녀였으면 오늘 아침과도 같은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를 종종 괴롭혀오던 내가 봤을 때, 그녀는 절대 마조키스트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익숙해질 법도 한 상황에서도 남들 이상의 수치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통을 두려워한다. 즐긴다-로 전환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니 그보다는 그런 심한 상처가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낫는단 말인가? 커튼 틈으로 살짝 보이는 그녀의 엉덩이는 아기의 피부처럼 하얗고 매끈하다.
“저, 다 입었어요. 수현님.”
“가자. 선생님 신세 졌어요.”
“그래. 또 놀러오렴.”
양호선생이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어준다. 그 얼굴에 차마 놀러온게 아니라는 말을 하지는 못한 것은 지금부터 공부하러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마 선생도 율희도 짐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용히 양호실 밖으로 나왔다. 행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따라와.”
“예.”
----<12장 end>
정신없네요. 봄이라는 건.
[email protected]
인기 야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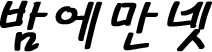
 밤에만넷
밤에만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