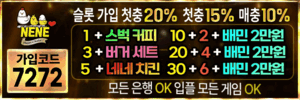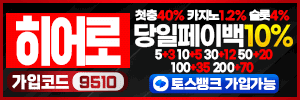서른의 난 스물다섯 그를 오빠 ... - 6부
2019.03.02 04:00
“좋아 보이네. 오늘은 아가로 대해줄까? 아니면 암캐로 대해줄까?”
어제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는 짓궂게 나를 놀리며 대화를 시작했다. 첫 대화부터 얼굴이 붉어진 나는 가볍게 눈을 흘겨보지만 그런 그가 밉기는커녕 정겹게만 느껴졌다. 그렇지만 그의 앞에선 살짝 토라진 얼굴로 애교를 부리고 싶었다.
아가 : 몰라. 피~ 보자마자 놀리기만 하구. 미워.
오빠 : 삐지니까 더 귀여운데. 진짜 너 같은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가 : 싫어. 여동생 안할래.
오빠 : 왜? 싫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가 : 오빠 여동생 되면 오빠 앞에서 이러지 못하잖아. 안할래.
따뜻한 미소를 가진 스물넷의 그의 앞에서 스물아홉의 나는 귀여움을 받고자 애교부리는 여자아이가 되었다. 이상하게도 연하의 그를 따르고 애교 섞인 몸짓으로 그의 여자가 되는 그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 되었다.
“너는 천상 여자야. 지금까지 어떻게 그걸 감추고 살았니?”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본능을 꺼내준 그가 말했다. 그의 말대로 그에게 하나씩 배워나가는 여자로서의 기쁨은 내게도 놀라웠다. 귀여움을 받기위해 가벼운 투정과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자가 되었을 때 행복을 느꼈다.
“아가야. 이제 팬티 벗어도 돼. 팬티 벗는 걸 허락해 줄께.”
행복감 속에서 서서히 흥분되고 있던 내게 그가 허락했다. 음모만을 간신히 가리고 있던 분홍의 작은 팬티는 다리를 타고 흘러 내려 발등에 얹어졌다. 그리고 느껴지는 스물아홉의 나를 부끄럽지만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는 다섯 살 연하 그의 시선.
다섯 살 연하의 그였지만 그는 여자인 나보다 더 여자를 잘 알고 있었다. 약간 부족한 듯한 가벼운 터치로 내 몸이 성에 눈을 뜨게 만들고, 흥분 직전까지의 자극만을 허락함으로서 성을 간절히 갈망하는 암컷으로 만들어 갔다.
“아아. 오빠.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반복적인 아쉬운 자극 속에서 내 몸은 점점 더 그에게 애원하게 되었고, 그가 바라는 대로 흥분된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뜨거운 신음을 내기 시작했다. 이제 여자에서 암컷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내게 제일 보이고 싶은 곳을 보여 봐. 예쁜 암캐야.”
흥분해 있는 암컷에게는 더 이상 수치심은 없었다. 그를 뒤로한 채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엉덩이를 들었다. 엉덩이는 두 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나는 스물아홉의 암컷으로 복종의 자세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 자세로 자위를 허락 받았다. 그러나 그는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암컷의 꼬리로 어울릴만한 것을 찾기 위해 고심했고, 마침내 탐스러운 털을 가진 볼터치가 내 몸의 일부가 되었을 때 침대 위엔 잠깐씩 내 꼬리가 되었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를 향해 꼬리를 흔들 수 있게 된 나는 네 발의 암컷이 되어 자유로운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었다. 스물아홉의 여자가 느끼는 억제된 오르가즘이 아닌 발정난 암컷의 본능적인 오르가즘이 밑바닥으로부터 차오르고 있었다.
“그래. 예쁜 암캐야. 네 발정난 보지를 마음껏 자랑해봐.”
그의 말은 순종적인 예쁜 암컷이 된 나를 절정으로 인도했다. 평상시엔 느낄 수 없었던 깊고 강한 오르가즘이 찾아왔고 그를 대신했던 손가락들이 질속으로 깊게 빨려 들어갔다. 숨이 멎을 것 같던 깊은 삽입을 경험하고는 옴 몸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풀리기 시작했다.
... 조금 전까지 그를 위해 흔들던 탐스러운 꼬리가 힘없이 밀려 떨어졌다.
뜨겁던 열정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아직 남아있는 아련한 여운을 느끼며 단잠에 빠져든다. 조금 전까지의 수치스러웠던 기억은 지워지고 달콤한 만족감만이 단잠에 빠진 나를 감싸고 있다.
. . .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진작 잠에서는 깨어났지만 눈을 뜨기는 싫었다. 눈을 뜨면 달콤했던 기억은 사라지고 일상의 스물아홉의 나로 돌아가 한낮의 수치스러웠던 흔적을 확인해야 했기에 더더욱 싫었다.
긴 한숨과 함께 눈을 떴다.
벌거벗은 알몸 여기저기엔 욕정의 흔적이 그대로 말라 남아 있었고, 음란함을 감추기엔 너무 작았던 팬티가 침대 아래 버려진 채 있었다. 그리고 내 몸에 들어와 날 암캐로 만들었던 물건들이 애액과 오물의 흔적을 지닌 채 흩어져 있었다.
부끄러운 흔적을 확인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 오는 것을 느꼈기에 서둘러 정리를 마쳤다. 허탈감이라고 해야 할까. 애욕의 흔적이 사라진 공간에는 아쉬움과 공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가끔은 그와의 이런 행위가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언제나 아니라는 결론을 얻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것은 분명했고 한 번도 그를 사랑한다고 느꼈던 적은 없었다.
그는 다만 복종해야할 자상한 안내자였고, 새롭게 알아가는 성적 충만함을 얻으려는 가녀린 내 몸을 탐한 적이 없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내가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건 왜 일까?
아마도 그와 단절된 오늘 밤이 더 길게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어제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는 짓궂게 나를 놀리며 대화를 시작했다. 첫 대화부터 얼굴이 붉어진 나는 가볍게 눈을 흘겨보지만 그런 그가 밉기는커녕 정겹게만 느껴졌다. 그렇지만 그의 앞에선 살짝 토라진 얼굴로 애교를 부리고 싶었다.
아가 : 몰라. 피~ 보자마자 놀리기만 하구. 미워.
오빠 : 삐지니까 더 귀여운데. 진짜 너 같은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가 : 싫어. 여동생 안할래.
오빠 : 왜? 싫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가 : 오빠 여동생 되면 오빠 앞에서 이러지 못하잖아. 안할래.
따뜻한 미소를 가진 스물넷의 그의 앞에서 스물아홉의 나는 귀여움을 받고자 애교부리는 여자아이가 되었다. 이상하게도 연하의 그를 따르고 애교 섞인 몸짓으로 그의 여자가 되는 그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 되었다.
“너는 천상 여자야. 지금까지 어떻게 그걸 감추고 살았니?”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본능을 꺼내준 그가 말했다. 그의 말대로 그에게 하나씩 배워나가는 여자로서의 기쁨은 내게도 놀라웠다. 귀여움을 받기위해 가벼운 투정과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자가 되었을 때 행복을 느꼈다.
“아가야. 이제 팬티 벗어도 돼. 팬티 벗는 걸 허락해 줄께.”
행복감 속에서 서서히 흥분되고 있던 내게 그가 허락했다. 음모만을 간신히 가리고 있던 분홍의 작은 팬티는 다리를 타고 흘러 내려 발등에 얹어졌다. 그리고 느껴지는 스물아홉의 나를 부끄럽지만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는 다섯 살 연하 그의 시선.
다섯 살 연하의 그였지만 그는 여자인 나보다 더 여자를 잘 알고 있었다. 약간 부족한 듯한 가벼운 터치로 내 몸이 성에 눈을 뜨게 만들고, 흥분 직전까지의 자극만을 허락함으로서 성을 간절히 갈망하는 암컷으로 만들어 갔다.
“아아. 오빠.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반복적인 아쉬운 자극 속에서 내 몸은 점점 더 그에게 애원하게 되었고, 그가 바라는 대로 흥분된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뜨거운 신음을 내기 시작했다. 이제 여자에서 암컷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내게 제일 보이고 싶은 곳을 보여 봐. 예쁜 암캐야.”
흥분해 있는 암컷에게는 더 이상 수치심은 없었다. 그를 뒤로한 채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엉덩이를 들었다. 엉덩이는 두 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나는 스물아홉의 암컷으로 복종의 자세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 자세로 자위를 허락 받았다. 그러나 그는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암컷의 꼬리로 어울릴만한 것을 찾기 위해 고심했고, 마침내 탐스러운 털을 가진 볼터치가 내 몸의 일부가 되었을 때 침대 위엔 잠깐씩 내 꼬리가 되었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를 향해 꼬리를 흔들 수 있게 된 나는 네 발의 암컷이 되어 자유로운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었다. 스물아홉의 여자가 느끼는 억제된 오르가즘이 아닌 발정난 암컷의 본능적인 오르가즘이 밑바닥으로부터 차오르고 있었다.
“그래. 예쁜 암캐야. 네 발정난 보지를 마음껏 자랑해봐.”
그의 말은 순종적인 예쁜 암컷이 된 나를 절정으로 인도했다. 평상시엔 느낄 수 없었던 깊고 강한 오르가즘이 찾아왔고 그를 대신했던 손가락들이 질속으로 깊게 빨려 들어갔다. 숨이 멎을 것 같던 깊은 삽입을 경험하고는 옴 몸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풀리기 시작했다.
... 조금 전까지 그를 위해 흔들던 탐스러운 꼬리가 힘없이 밀려 떨어졌다.
뜨겁던 열정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아직 남아있는 아련한 여운을 느끼며 단잠에 빠져든다. 조금 전까지의 수치스러웠던 기억은 지워지고 달콤한 만족감만이 단잠에 빠진 나를 감싸고 있다.
. . .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진작 잠에서는 깨어났지만 눈을 뜨기는 싫었다. 눈을 뜨면 달콤했던 기억은 사라지고 일상의 스물아홉의 나로 돌아가 한낮의 수치스러웠던 흔적을 확인해야 했기에 더더욱 싫었다.
긴 한숨과 함께 눈을 떴다.
벌거벗은 알몸 여기저기엔 욕정의 흔적이 그대로 말라 남아 있었고, 음란함을 감추기엔 너무 작았던 팬티가 침대 아래 버려진 채 있었다. 그리고 내 몸에 들어와 날 암캐로 만들었던 물건들이 애액과 오물의 흔적을 지닌 채 흩어져 있었다.
부끄러운 흔적을 확인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 오는 것을 느꼈기에 서둘러 정리를 마쳤다. 허탈감이라고 해야 할까. 애욕의 흔적이 사라진 공간에는 아쉬움과 공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가끔은 그와의 이런 행위가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언제나 아니라는 결론을 얻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것은 분명했고 한 번도 그를 사랑한다고 느꼈던 적은 없었다.
그는 다만 복종해야할 자상한 안내자였고, 새롭게 알아가는 성적 충만함을 얻으려는 가녀린 내 몸을 탐한 적이 없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내가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건 왜 일까?
아마도 그와 단절된 오늘 밤이 더 길게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인기 야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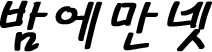
 밤에만넷
밤에만넷